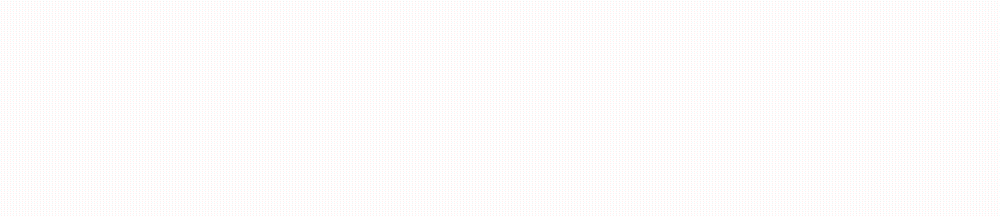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복지시설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실제 기부금에 해당이 되는지, 거래 내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지난 29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이 발언은 CJ프레시웨이의 ‘이상한 기부금’ 논란이 단순한 기업 관행이 아닌 세법 위반과 형사책임의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앞서 KBS는 CJ프레시웨이가 복지시설 납품 계약 과정에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부금 명목으로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서울의 한 노인요양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CJ프레시웨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으며, 계약서에 ‘매출의 5%를 기부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만 기부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되면 기부도 끝나는 구조였다. 4년 동안 해당 요양원은 32억 원어치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8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CJ프레시웨이는 2022년부터 3년간 전국 480개 복지시설에 총 135억 원의 기부금을 지급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납품 거래 관계에 있는 시설이었다. 기부금품법은 ‘기부는 어떠한 대가나 조건 없이 제공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CJ프레시웨이의 방식은 기부가 아니라 거래 조건에 포함된 리베이트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사회공헌 활동으로 분류했고, ESG 경영의 일부로 홍보해왔다.
내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프로핏 부스트’라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기부금 지출분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 단가를 자동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쉽게 말해, 기부금으로 나간 돈을 식자재 가격에 다시 반영해 회수한 셈이다. 복지시설은 겉으로는 기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더 비싼 식자재를 사야 했다. ‘기부금’을 가장한 거래비용이 결과적으로 노인 복지시설의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로 이어진 것이다.
CJ프레시웨이는 2024년 ESG 보고서에서 “기부금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공헌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는 대표이사 이건일을 비롯해 경영지원실장, 전략지원담당, 준법지원인 등 내부 임원들이 참여한다.
기부금이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집행된다면, 대표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2024년 보고서에는 “사회공헌위원회가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부금이 매년 급증하며 영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평이다.
CJ프레시웨이의 기부금은 2022년 39억 원, 2023년 68억 원, 2024년 8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복지시설 전용 브랜드 ‘헬씨누리'의 매출도 5년간 연평균 25%씩 상승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수도권 노인복지시설 식자재 시장에서 4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기부금이 늘수록 헬씨누리 매출이 오르는 흐름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CJ프레시웨이는 “업계 전반의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대표가 직접 참여한 위원회에서 매년 기부금 규모가 늘고 관련 사업 매출이 함께 상승했다면 그것은 관행이 아니라 구조다. 기부를 통해 선한 이미지를 쌓는 대신, 회사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도구로 활용했다면 그 책임은 현장 직원이 아닌 최고경영자에게 귀속된다.
국세청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부 회계 검토로 끝낼 가능성은 낮을것으로 보인다. 기부금의 성격이 영업비용으로 판단되면 세법상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며,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와 검찰 이첩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