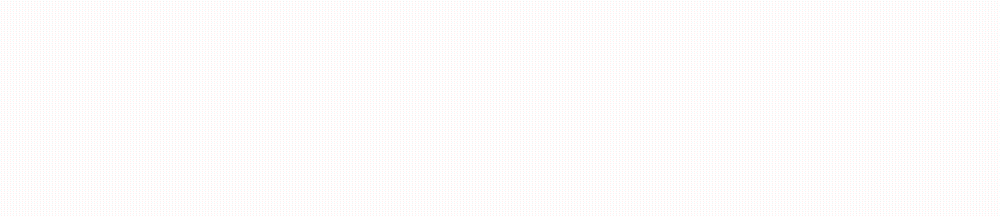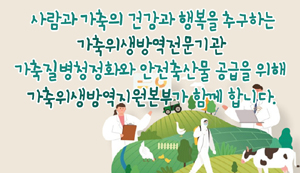백령도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외딴 섬이다.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위상보다 더 눈길을 끄는 건, 이 작은 섬이 점박이물범이라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그 섬에서, 인간의 편의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의 생태계가 고요히 무너지고 있다.
최근 백령도 하늬 앞바다에서 불과 7m 거리에 들어선 A레미콘 공장이 그 중심에 있다.
공장은 하루에도 수십 톤의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 공장에서 스며드는 오염물질과 그것이 남긴 흔적들이다.
한때 바위마다 굴이 자생하며 어민들의 삶터이자 자연의 보고였던 바다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굴을 따러 나가지 않는다.
바다는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바다의 침묵이 곧 점박이물범의 비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하고 국제사회가 보호종으로 분류한 점박이물범은 해마다 백령도 앞바다에서 번식을 한다. 그런데 이 소중한 서식지 코앞에 중장비와 공장이 자리 잡았다.
수십 미터 거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와 폐수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무지이거나 무책임이다.
여기에 실험실장도 없이 운영된다는 공장의 실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기준' 없는 편의를 얼마나 쉽게 허용하는지를 보여준다. 레미콘은 건설의 뼈대를 이룬다.
품질 관리 책임자가 없는 생산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안전마저 위협한다.
환경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만으로는 살아 있는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오염이 확인된 뒤에 내릴 행정조치는 이미 늦은 대응일 수 있다.
백령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과한 것이 아니다.
단지 이 섬이, 그리고 이 바다가 다시 물범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남기를 바랄 뿐이다.
물범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그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침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태계는 언제나 가장 연약한 존재부터 무너진다.
백령도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