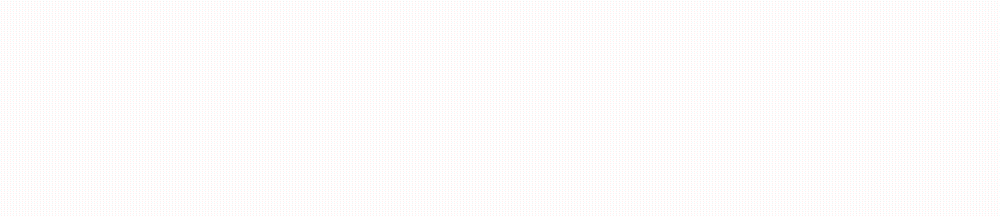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집단을 수십 년간 지배한 무노조 경영의 원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로 인해 노동권을 무시한다는 비판과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도, 삼성의 조직 깊숙이 각인된 노조 배제의 DNA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 DNA는 오늘날 삼성화재 자회사에서도 확인된다. 1996년 설립된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은 삼성화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콜센터 상담, 상품 안내, 계약대출 업무뿐 아니라 장기·일반보험 가입 고객의 신체·재산 사고에 따른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 심사 등 핵심 보험 업무를 대행한다. 말하자면 서비스손사는 단순한 외주 용역이 아니라 삼성화재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손발’ 역할을 하는 회사다.
이런 회사에서 29년 만인 올해 3월 처음 노조가 출범했지만, 사측의 대응은 교섭 지연과 단체교섭 무력화였다. 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 성과급 적용, 사무실 제공, 기본 활동 보장 요구에 대해 사측은 “법 조항 외에는 수용 불가”라며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했다. 교섭일에 교섭위원에게 업무를 배정해 참석을 어렵게 만들고, 노조가 발송한 공문은 미개봉 상태로 방치됐다는 사례까지 나왔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최소한의 합의만 이뤄졌지만, 사측은 단체교섭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하며 노조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법원은 이미 교섭을 무의미하게 끌거나 위원을 배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 서비스손사의 행태는 이러한 판례와 상당 부분 겹친다. 그럼에도 사측은 노조 출범 전부터 운영해온 ‘사원협의회’를 근거로 단체교섭을 회피하면서, 창업주가 남긴 무노조 경영의 잔재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갈등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법과 제도의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자회사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 시 쟁의행위까지 가능하다. 근로자와 노조의 범위가 넓어지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제한되면서 자회사 노조의 협상력은 크게 강화된다. 업계에서는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교섭 지연을 법 시행 전에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한다.
2020년 이재용 회장은 무노조 경영의 종식을 선언했지만, 서비스손사의 현실은 여전히 창업주 이병철의 발언이 남긴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다. 교섭을 지연하고 협상을 무력화하는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 이병철 회장의 DNA가 삼성화재 노조 협상에도 작동하고 있다면, 무노조 폐지 선언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