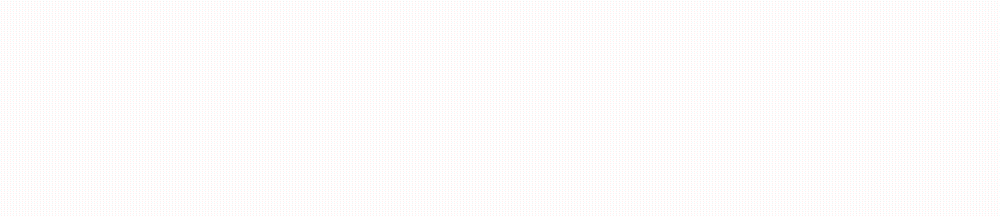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금융권이 기업금융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손실 위험이 적지만, 기업대출은 자본 부담이 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규제 장벽을 낮춰야 은행이 기업금융에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겉으로만 보면 기업금융 확대를 위한 강한 의지로 읽히지만, 정작 우리은행의 성적표는 이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79조 원으로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적었고, 지난해 말 대비 3.7% 감소해 감소 폭 역시 최대였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은 2.5%, 하나은행은 3.2%, 농협은행은 3.3% 늘렸고 신한은행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은행만 뚜렷하게 역주행한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건전성 지표다.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9%로 4대 은행 평균(0.50%)을 웃돌며 가장 높았다. 수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상승 속도가 문제다. 지난해 2분기 0.39%였던 연체율은 같은 해 4분기 0.40%, 올해 1분기 0.50%로 올라섰고, 불과 1년 만에 0.59%까지 치솟았다. 짧은 기간에 0.2%포인트가량 오른 것은 자산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위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와 실제 지표 사이에 엇박자가 생긴 셈이다. 그룹 차원에서는 “기업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구호를 내세우지만, 현장에서는 대출 축소와 연체율 상승이라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난다. 외부적으로는 공격적 드라이브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건전성 우려에 발목 잡힌 모습이다.
정진완 행장의 이력은 이 모순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는 중소기업금융 부문에서 잔뼈가 굵은 영업통으로, 취임 당시에도 기업금융과 개인사업자 대출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기대와 달리 대출 감소와 연체율 악화였다. ‘기업금융 명가’ 복원을 외쳤지만, 시장이 받아들인 신호는 오히려 위축과 불안이었다.
우리은행이 직면한 과제는 분명하다. 규제 완화 요구를 앞세우기보다 먼저 흔들린 건전성을 다잡아야 한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충당금을 보강하며, 취약 차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금융 확대 전략이 구호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금처럼 메시지와 성과가 엇갈린다면, 우리은행의 기업금융 전략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