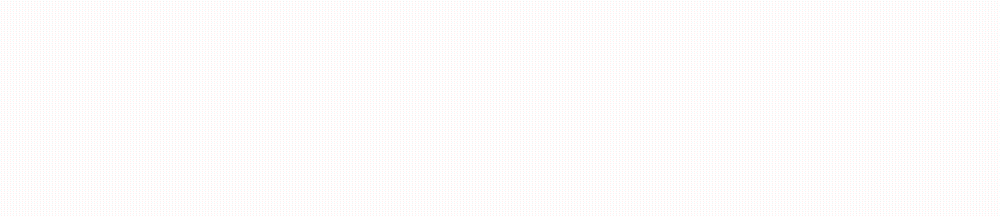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처벌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고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씌우는 ‘거짓 고소’의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벌어지거나 물증이 희박한 경우가 많아, 피의자 진술과 피해 주장자의 신빙성 여부가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A 씨 사건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A 씨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서로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 여성은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A 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후 이를 빌미로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혐의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판단,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상대 여성은 고소 이전부터 여러 차례 금전적 요구를 했고, 사건 당시와 이후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A 씨 측은 수사기관에 철저한 사실관계를 요구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대연 박종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피의자가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압박을 느끼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이를 번복하더라도 신빙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얼마나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유무죄 판단의 분수령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경우, 상대방 진술의 합리성과 논리적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 진술 중심주의’가 강한 상황일수록 피의자의 진술은 더욱 조심스럽고 명확해야 한다.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초기 조사부터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종민 변호사는 “특히 거짓 고소인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나 주변 진술,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도 함께 가져야 한다. 거짓 고소는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넘어,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마저 왜곡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성범죄 무고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