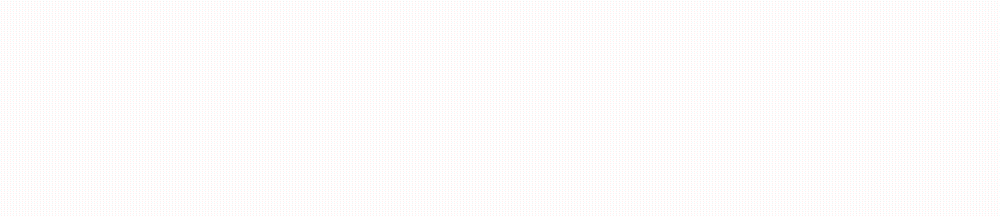이혼 협의나 재판에서 재산 분할과 함께 가장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부분이 자녀 문제다. 특히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싸고는 부모 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명칭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이혼 시 반드시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친권을 주기도 하였지만, 최근 법원은 ‘실제 양육자 원칙’을 강조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한 사람에게 주는 결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혼 당시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지만 친권은 아버지, 어머니 공동 친권으로 한 경우를 살펴보면, 자녀의 전학, 거주지 결정, 의료행위, 여권발급, 보험 가입 등 자녀의 생활 전반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친권자인 아버지가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부모의 갈등이나 의사소통의 부재로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자녀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기 보다는 실제 양육자에게 친권을 주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생활 안정성을 이유로 잦은 변경을 꺼린다. 처음 협의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은 이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의무가 수반됩니다. 이후 환경이 달라질 경우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지만, 초기부터 현실적인 양육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고 설명햇다.
이어 “자녀 문제는 법적 권리를 넘어 삶의 방향과 직결된다.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