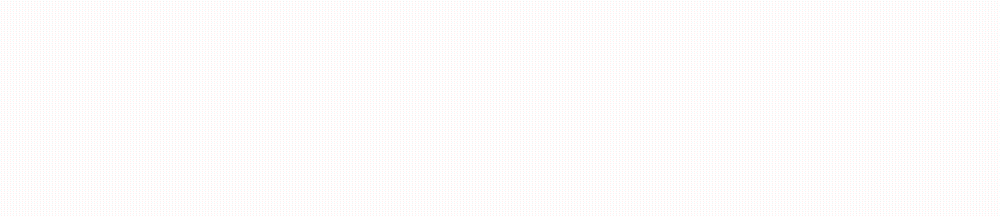아모레퍼시픽그룹이 서경배 회장과의 RSU(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지급 약정을 뒤늦게 공시에 반영하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애초 공시에서 총수와의 계약 사실을 빠뜨린 것이 드러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시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서 회장은 작년 7월, 자신에게 부여된 RSU를 전량 취소하며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수령 주식 수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 따르지만, 실제 배경은 가볍지 않다. 공정위가 2024년부터 총수 일가의 RSU 약정을 별도 공개하며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고, RSU를 받은 총수 기업 3곳 중 하나로 아모레퍼시픽이 포함되면서 사회적 시선과 규제 부담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모레퍼시픽의 25년 공시에 따르면, 대주주 관련 RSU 누적부여수량은 총 25,041주이며, 이중 서 회장에게 부여된 수량은 9,239주로 전체의 약 36.9%에 달한다.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의 경우, 총 누적부여수량 58,645주 가운데 서 회장 몫은 18,639주로 31.8%를 차지한다. RSU는 단기 보상을 넘어 장기 성과 보상 체계의 핵심 수단인데, 이처럼 대주주에게 상당 부분이 몰리는 구조는 내부 보상체계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서경배 회장이 겸직하고 있다. 보상위원회가 사외이사 과반 구성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요 보상 안건이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셀프 보상’ 구조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부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평가기관은 이 같은 겸직 구조가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서경배 회장 RSU 수령 취소 관련 사항을 공정위 기준에 부합하게 기재하기 위해 정정 공시했다"라고 해명했다. 핵심은 수량이 아니다. 총수가 임직원 성과보상 체계의 수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동시에 그 체계의 설계자이자 승인권자라는 구조적 이해상충이 문제의 본질이다. 공정위가 RSU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