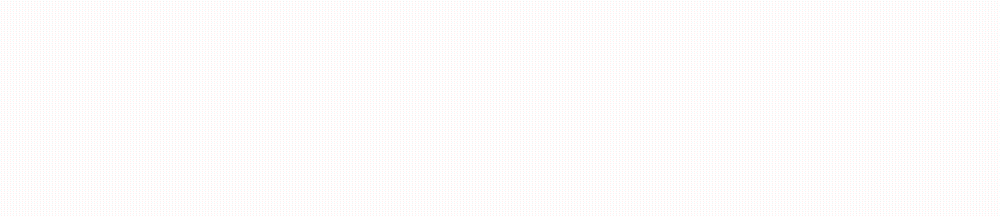헌법재판소가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인들이 진짜 상속인이 아닌 사람(참칭상속인)이 상속인처럼 행세하며 상속재산을 침탈했을 때, 진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며,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간 제한을 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사건의 배경은 망인 사망 20년 후 친생자 인지된 청구인 A씨는 1998년 사망한 망인 B의 딸이었지만, 오랜 기간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았고, 2019년에서야 생부가 망인 B임을 알게 된 A씨는 법적 인지 절차를 거쳐 2021년에야 친생자임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미 20년 전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처분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민법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청구권)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달라”고 청구하려 했지만, 법원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면서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에 A씨는 “망인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행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2024년 6월 27일 전원재판부 결정(2021헌마1588)에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뒤늦게 인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즉, 망인의 사망을 뒤늦게 알고 친생자 인지 또는 재판으로 상속인으로 확정된 사람이더라도,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분 상당 금액 청구가 봉쇄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또한 10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기존 상속인들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기존 상속인의 법적 안정성은 ‘기여분 공제’ 등의 제도로도 보호할 수 있으며, 뒤늦게 인지된 자녀의 상속권을 형식적으로만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실질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10년)’이 적용돼 소송조차 못하던 사례들, 즉 친생자관계 확인 또는 인지 판결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라도, 이제는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이라는 형태로 상속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의 허윤규, 김도윤, 허용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상속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질적 정의를 강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제척기간 도과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고 있던 분들도 권리행사를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