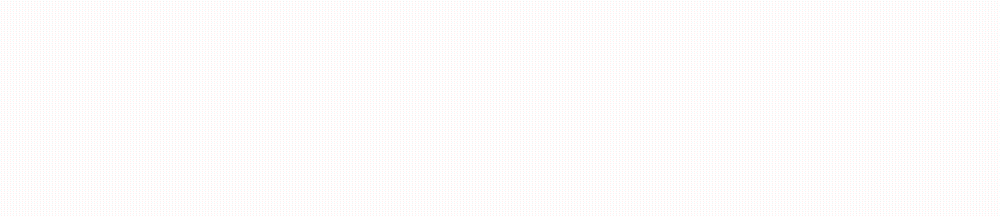진폐증을 앓던 탄광마을 주민들이 잠시 바람 쐬러 앉던 태백병원 앞 등나무 벤치에 무명실을 이용한 거대한 미술 작품이 설치됐다. 태백 깊은 골짜기까지 침투한 분단의 흔적인 망루는 빨간 내복을 입고 치유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방과 후 달리 갈 곳이 없는 마을 청소년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던 PC방 건물에는 지하 미술관이 생겨 아이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대표적인 폐광 마을 태백시 장성마을 일대에서 오는 30일까지(월요일 휴관) 제 2회 ‘비엔날레 날땅:뜻밖에 등장하는 윤곽들’이 열린다.
장성마을은 한 때 6000명이 넘는 광부가 수백 톤의 석탄을 캐내던 장성광업소가 있던 곳으로, 탄광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겪은 공간이다. 광산 폐쇄로 문화 소외가 깊어진 장성마을에서 2023년 첫 선을 보인 ‘비엔날레 날땅’은 지역 아이들에게 현대미술을 만날 기회를 열어줬다.
작가들은 장성마을의 서사를 작업에 담았고, 장성마을 주민들과 아이들도 작품에 참여했다. 또 다른 폐광지역인 정선에서도 비엔날레 날땅의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1시간여를 걸려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진아 ‘2025비엔날레 날땅’ 미술감독은 “이번 비엔날레는 장성마을과 열심히 사귀어 온 작가들이 폐광 마을 아이들과 주민에게 열어 보여주는 ‘나니아 연대기’의 옷장과도 같은 것”이라며 “마을 분들이 늘 반복해서 보던 일상의 공간들을 새로운 세계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비엔날레 날땅에는 정희우, 황재순, 신예선, 배주현, 전지, 이다슬 6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신예선 작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감시를 위해 쓰인 태백경찰서 망루에서 광산 갱도와 폐광이 가진 폐쇄적 공간감을 포착했다. 신 작가는 망루를 빨간 내복을 상징하는 모직 내피로 덮어 이 공간에서 따듯하고 포근함이 느껴지게 했다.

태백경찰서 망루에 설치된 신예선 작가의 ‘빨간 내피’. (사진제공=탄탄마을협동조합)
배주현 작가는 한 광부가 70년 넘게 생활한 고택에서 무명실과 도자기를 이용한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탄광의 어둠 속에서 수많은 손들이 움직이던 노동의 숨결을 재현한 작품이다. 시간과 기억, 감각과 관계, 형태와 소멸을 주제로 한 배 작가의 설치 작업은 태백병원 등나무에서도 만날 수 있다.

배주현 작가의 작품 '있다, 잇다'. 한 광부가 70년 넘게 생활한 고택에 무명실과 도자기를 이용해 탄광 지하 어둠 속에서 움직이던 수많은 노동의 손길을 표현했다. (사진제공=탄탄마을협동조합)
전지 작가는 장성마을 지역 청소년의 스토리를 담은 만화 작업을 선보였다. 청소년들의 웅크림과 망설임, 조심스러운 순간을 태백의 대자연과 고요한 마을을 배경으로 섬세하게 풀어냈다. 전지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지하 공간은 지역 청년들이 직접 청소하고 페인트칠해 전시관으로 재탄생했다.
황재순 작가는 광산지역 목욕탕 ‘태양사우나’를 기억과 회귀의 장소로 되살렸다. 2022년 폐업한 태양사우나는 과거 광업소 내 목욕시설이 부족했던 시절, 광부들이 검댕을 씻어내던 곳이었다. 태양사우나는 황 작가가 축적해 온 광산 마을의 목욕 문화에 관한 아카이브 전시관이 됐다.
장성광업소의 광부 아파트인 화광아파트를 기억하는 특별 사진전도 열린다. 2019년 화광아파트 철거 당시 태백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꾸린 ‘찰칵 원정대’가 담은 사진들을 화광아파트 자리에 들어선 마을 영화관 옥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
‘비엔날레 날땅’ 작품을 설명해주는 도슨트 투어도 진행된다. 장성마을 초입 식당 ‘차림’에서 모여 출발해 마을 곳곳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지난 주말 ‘비엔날레 날땅’ 전시를 관람한 태백 주민 김동찬 씨는 “자주 다니던 곳이 낯설고 신기해졌다”며 “마법에 걸린 새로운 동네 같다,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