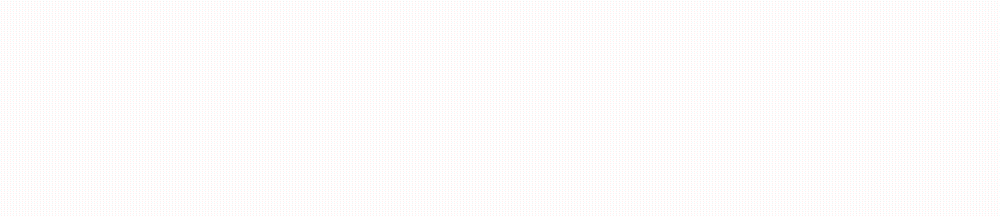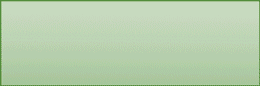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전직 우리은행장들에게 출마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회장 인선의 공정성과 이사회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근 감독당국이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과 연임 구조 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과 맞물리며, 우리금융을 향한 당국의 시선도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우리은행장 ‘출마 만류’ 정황
뉴데일리가 9일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리금융 고위 인사가 복수의 전직 우리은행장들에게 직접 연락해 “이번에는 회장 선거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출마를 만류했다는 제보가 금융권 내부에서 제기됐다. 해당 전직 행장들은 통상 회장 후보 롱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번 인선 과정에서는 모두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한 전직 은행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직 행장이면 규정상 후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나 역시 롱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 만류 연락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내부에서는 이미 판이 정해졌다는 인식도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은 관련 의혹에 대해 “회장 후보군은 공모 방식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로 이사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그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심사한다”며 “특정 인사가 후보를 임의로 포함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임추위를 가동해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종 후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현재 숏리스트에는 임종룡 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인사 2명 등 총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임추위 7명 중 6명 ‘임종룡 체제’…이사회 구성도 도마
이번 논란은 최근 우리금융 이사회와 임추위 구성 변화와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현재 7명이며, 이들 전원이 임추위 위원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윤인섭 이사 1명을 제외한 김춘수, 김영훈, 이강행, 이영섭, 이은주, 박선영 등 6명은 모두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새롭게 합류한 인사들이다. 결과적으로 현 임추위 7명 중 6명이 임 회장 재임 기간에 선임된 인물로 채워진 구조다.
올해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4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며 이사회에 큰 변화를 줬다. 동시에 기존 사외이사 일부는 ‘지주·은행 사외이사 겸직 해소’를 명분으로 우리은행 이사회로 이동하면서 지주 이사회에서는 빠졌다. 이 과정에서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비중도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6명 중 5명(83%)이 과점주주 추천 이사였지만, 올해는 7명 중 4명(약 57%)으로 줄어들었다. 금융권에서는 과점주주 추천 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 비중 축소 역시 이사회 독립성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 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이사회가 균형 있게 구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그런지 보니 다들 연임 욕구가 많으신 것 같더라”며 “그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고, 후보자들도 경쟁이 되지 않는 분들을 들러리처럼 세운다면 이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지배구조가 최대한 공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