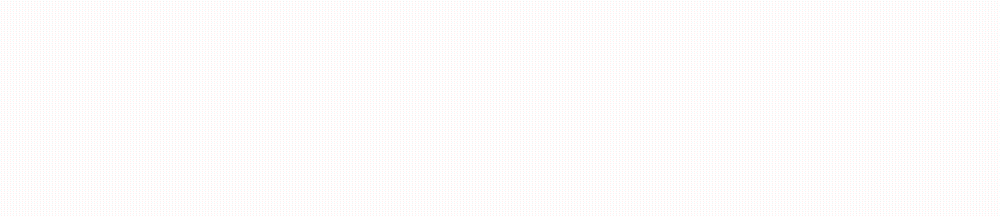10월 16일 대법원이 내린 ‘세기의 이혼’ 판결은 단순한 부부의 결별을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재산분할 원칙을 뒤흔들었다. 대법원 1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재산 형성 여부인데 항소심은 이 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어 노 관장의 간접적 기여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며 이를 부정한 것이다.
자금의 불법성을 근거로 재산 형성 과정 전체를 배제한 것이다. 문제는 이 판단이 불법자금의 실체나 영향력을 따져보지 않은 채, ‘불법이면 논외’라는 논리를 적용한 것인데 문제는 기업 가치 형성에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기존 판례의 뼈대를 바꾼 결정”이라 평가한다. 이혼 재산분할은 지금까지 혼인 기간 중의 공동기여를 중심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조항을 직접 적용하면서, 이제는 재산의 형성 과정이 ‘합법적이었는가’가 먼저 따져지는 구조로 바뀌었다. 자금의 출처를 검증할 능력과 자료 접근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쪽 즉, 대기업 총수나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혼인 파탄 전 증여된 재산’의 처리다. 최 회장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재단과 친인척에게 SK 및 SK C&C 주식 수백만 주를 증여했다. 일반 가정의 경우라면 이런 행위는 ‘재산은닉’이나 ‘분할 회피’로 간주되어 분할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영권 유지나 안정적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공동재산의 유지·증식에 해당한다”며 예외를 인정했다. 다시 말해, 총수의 주식 증여가 가정생활의 재산 축소가 아니라 ‘기업 경영 행위’로 인정된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만들어내는 함의는 막대하다. 재벌 총수의 재산 이동은 ‘경영 목적’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게 되고,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만큼 좁아진다.
이로써 대법원은 두 가지 보호막을 동시에 쳐줬다. 첫째, 불법자금은 기여로 인정할 수 없으니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 둘째, 혼인 중이라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증여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이 조합은 사실상 최태원 회장을 위한 맞춤형 방패로 작용했다. 불법자금의 실체는 따지지 않고, 사전 증여의 동기는 ‘경영 목적’으로 합리화됐다. 법의 형식은 중립이었지만, 결과는 한쪽으로 기울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은 재벌 이혼소송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꾼 선례”라고 지적한다. 앞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자금 출처와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면, 법원은 실질 기여를 논하기 전에 불법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여부의 입증은 막대한 자료와 회계 분석을 요구하며, 개인 배우자가 그 증거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재벌가·고소득층의 ‘방어 전략’은 더욱 체계화되고, 일반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정교했지만,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균형을 잃었다. 불법이기 때문에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결과적으로 불법적 자금의 수혜자를 보호하는 구조로 작동했다. 불법자금을 받은 쪽이 아니라, 불법을 통해 재산을 확대한 쪽이 혜택을 보는 모순이 발생한 셈이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소송이 아니라, 법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남았다. 불법의 이름으로 재산분할을 배제한 결과가 정의의 회복이 아니라 권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법의 승리가 아니라 법의 후퇴다. 최태원 회장은 당장의 부담을 덜었을지 몰라도, 그가 얻은 것은 면죄가 아니라, ‘불법조차 경영논리로 포장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냉혹한 판례를 남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