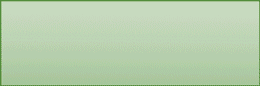무더위를 잊기 위해 전국 곳곳에 여름 콘서트와 페스티벌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관람객들이 모이고 있다. 현장의 열기와 음악은 큰 즐거움을 주지만, 장시간 큰 소리에 노출되면 청력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연 후 귀가 먹먹하거나 ‘삐-’하는 이명이 계속된다면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한다.
소음성 난청은 단기간 큰 소리에 노출돼 발생하는 음향 외상과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소음의 기준은 85dB이지만 공연장에서는 순간적으로 120dB 이상 치솟는 경우도 많고, 폭죽 또한 120~140dB에 달해 귀에 많은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소리의 크기뿐 아니라 노출 시간 역시 난청의 위험도를 결정하며, 소리가 클수록 안전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면목 소리의원 전영명 원장은 “큰 소음에 노출된 후 나타나는 청력감퇴 현상은 대부분 수 시간에서 하루 내 회복되지만, 반복되면 결국 영구적인 청각세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음향 외상은 단 한 번의 강한 소리만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성 음향 외상의 경우 응급조치로 약물치료가 도움 될 수 있다. 이때에는 스테로이드 요법, 아스피린, 비타민 E 병합 요법 등이 활용된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영명 원장은 “과거에는 건설 현장이나 항공업 등 고소음 작업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로 발견됐지만, 최근에는 이어폰 장시간 사용, 클럽이나 공연 관람 등으로 젊은 난청 환자가 늘고 있다. 예방을 위해 큰 소음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고, 불가피할 경우 청력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연 관람 시 스피커와의 거리를 확보하고, 음악용 이어플러그 등 소음 차단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공연 중간에는 10~15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 귀를 쉬게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공연장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청력 보호 습관이 필요하다. 음악 감상 시 이어폰 볼륨은 전체의 60% 이하로 설정하고, 1시간 사용 후 5~10분간 휴식하는 ‘60-60 규칙’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하철, 도로변 등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이어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