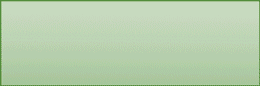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한 회계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권익, 금융투명성, 나아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크다. 최근 금융감독 체계가 18년 만에 개편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정책적 영향력은 축소됐고, 해법은 사실상 국회의 몫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논란의 출발점은 유배당 보험상품이다. 삼성생명은 1990년대 초 모집한 보험료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했고, 평가이익 중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계정에 반영해왔다. 국제회계기준(IFRS17)은 확정 배분 의무가 있으면 부채, 재량적 성격이면 자본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지만 삼성생명은 감독당국의 예외를 근거로 이를 유지했다. 현재 해당 계정은 약 9조 원 규모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훌쩍 웃돈다. 사실상 계약자 몫을 공수표처럼 처리하며 배당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4월 삼성화재가 5,12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새로운 쟁점이 떠올랐다. 삼성생명 보유 지분율이 14.98%에서 15.43%로 상승한 것이다. 보험업법상 15% 이상이면 자회사 편입이 필요하고, IFRS 기준상 20% 미만이라도 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되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순이익 일부가 삼성생명 연결손익에 반영되고, 이는 곧 유배당 계약자 배당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반기보고서에서 “유의적 영향력을 입증할 만한 사실관계가 없다”며 삼성화재를 단순 계열사로 분류하고 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로써 순이익 반영과 배당 재원 확대를 피한 셈이다.
회계 전문가들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이 같은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행 K-IFRS는 피투자자의 의사결정 참여, 중요 거래, 인사 교류, 필수 기술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의적 영향력을 인정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공동투자와 인사 교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관계기업 분류 근거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코리아크레딧뷰로(6.2%), 에이앤디신용정보(19.5%) 등 20% 미만 지분율을 가진 회사들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한 전례도 있다. 결국 이중잣대를 통해 회계처리를 유리하게 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회계 특혜 논란은 결국 ‘삼성생명법’으로 귀결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취득원가는 5,444억 원에 불과하지만 시가는 35조 원을 웃돈다. 상반기 기준 총자산의 3%는 9조5천억 원으로, 단순 계산 시 약 26조 원 규모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이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근간을 흔드는 뇌관이 된다.
과거에도 삼성생명법 논의는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이해를 조정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위헌적 특혜를 바로잡고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도적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의 선택이 삼성생명은 물론 한국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 회복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